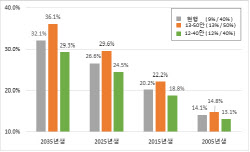|
우리의 정책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실험들을 벤치마크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작년 4월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의 종목군에 주가 부양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단 ‘왜 저PBR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가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몫인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때 PBR이 1배를 밑돌게 된다.
PBR이 1을 하회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으면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게 된다. ROE는 자기자본의 증식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이다. ROE가 낮은 기업의 자기자본은 장부가치보다 낮게 헐값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저PBR이 실은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PBR 종목의 리레이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자산가치 대비 디스카운트돼 있는 종목들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와 ‘이런 흐름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ROE가 낮은 기업들은 PBR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익성을 제고해 ROE를 높이면 PBR도 상승하게 된다.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면 되는데, 이는 ‘착하게 살자’는 말 만큼이나 공허하다. 어떤 현상을 불러온 인과관계나 선후관계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애초에 ROE와 PBR이 낮지 않았을 것이다. 저PBR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자극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묘수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저ROE와 저PBR 탈피의 대안은 주주환원이다. 한국보다 먼저 저PBR 종목군 리레이팅에 나섰던 일본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단지 자본시장에 국한된 이슈라기 보다는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로 주주환원이 차용됐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개발 연대기에 일본이란 공동체가 쌓아온 부가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를 순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2014년 8월, 아베 내각의 경제 책사였던 히토츠바시 대학 이토 구니오 교수가 집필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 -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라는 리포트에 잘 녹아들어 있다.
일본도 PBR이 낮은 기업들이 많았다. 과거 고성장기에 쌓아놓은 자산의 규모는 컸지만, 이 자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컸기에 PBR이 낮았을 것이다. 이토 교수는 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되면, 이 돈이 소비에 사용되거나, 더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되면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환원은 ROE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은 그만큼 감소한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분모인 자기자본을 줄임으로써 자본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부의 순환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주주환원을 정책이 강제할 수는 없다. 주주환원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영역이다. 아베 정부는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타개하려 했다.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일본 자본의 힘만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었다. 일본은 한 다리 건너면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는 관계 자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과 각을 세우는 주주권 행사는 수용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아베 정부는 외국 자본의 힘을 빌렸다. 일본 내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일본으로 불러 들였다. 아베는 게이단렌 등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외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일본 진출을 환영한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적대적 M&A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계 자본으로 주주행동주의의 물고를 튼 이후, 이런 흐름은 일본 투자자들에게로 확산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흐름이 강화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외국계 자본이든, 토종 자본이든 주주권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민간의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외국 자본에 배타적인 한국 사회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은 변화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일본이 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관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 사회가 처절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다.
2013년 아베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 일본 사회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2009년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던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파격적 변화를 선택했던 셈인데, 이후 민주당 집권기는 그들의 무능력만 확인하고 짧게 막을 내렸다.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치면서 ‘안전한 일본’이라는 신화가 붕괴됐다. 뭘 해도 안된다는 집단적 패배감 속에서 아베가 정권을 잡았다. 철저한 실패를 겪은 일본 사회는 파격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일본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의 해법으로 일본을 벤치마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민간의 동력 없이 정책 외끌이만으로 목표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3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