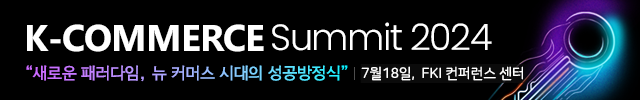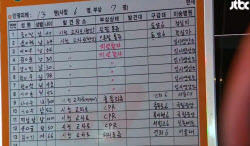|
‘격세지감’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1960년대 정말 먹을 게 없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난 라면이 이젠 그 어떤 요리도 거만하게 밀어내는 ‘메인디시’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세월의 깊이가 적지 않다. 태생은 1958년 일본 닛신식품이 개발한 ‘치킨라멘’.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라면이었다. 일본 역시 못 먹고 못 살기는 마찬가지였던 때에 가히 식품업계의 혁명으로 출현했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제조기술을 들여온 삼양식품이 5년 뒤인 1963년 국민 앞에 야심차게 들이밀었다. ‘삼양라면’이다.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았다. ‘라면’과 ‘라멘’이 한국과 일본에서 나라 전체를 국수발 하나로 묶어낸 국민음식이 된 것은. 그럼에도 두 그릇은 다르다. 태생은 얼추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성질에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하나는 유탕 처리한 인스턴트면에 짜고 매운 수프를 넣어 끓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면을 다양한 육수에 풀어 끓여내는 거니까.
|
마침내 일본인의 일상이 된 라멘을 두고 저자는 ‘일본인 혈관에는 라멘 육수가 흐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세심하게 드러낸다. 라멘 하나로 꿰뚫어본 민족성·민족주의의 단면이 절절하다. 이 기세에 밀려 한국의 본격적인 라면이야기는 여기선 좀 참아야 할 듯하다.
▲라멘 한 그릇엔 농축한 우주 들었다?
‘인생은 자기표현. 라멘은 삶의 원천.’ 일본 어느 라멘집에 걸린 구호란다. 도쿄에서 라멘집을 낸 한 미국인은 ‘라멘은 소우주’라고까지 했다고. 서양의 긴 코스요리가 단 한 그릇에 야무지게 담겼다는 찬사란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언제부터 라멘이 설교를 하는 음식이 됐나. 이런 의문은 저자가 여러 라멘집을 헤집으며 국수발에 묻은 시대상을 건져 올리는 수고를 자처한 근거가 됐다.
라멘은 사실 면의 제조방식에서 나온 말이란다. 손으로 길게 잡아 늘인 면. 흔히 ‘수타’라고 말하는 국수 맞다. 수타는 중국식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언제부턴가 일본이 자진해서 라멘에 드리운 중국색을 지워가고 있다는 거다. 손으로 때려 늘인 면을 쓰지 않고 고명도 일본식으로 골라 올리는 등.
그럼에도 일본인은 아직 라멘을 중국음식이라고 생각한단다. 메이지시대(1868~1912) 중기 요코하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차이나타운의 길거리음식 ‘난킹소바’로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랬던 난킹소바가 현대적인 라멘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발명이 있었다. 수프에 간장을 추가한 것, 가쓰오부시나 말린 멸치 등 일본재료로 국물맛을 낸 것, 면을 탱탱하게 만든 것.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일본인의 대표 민족성인 ‘세계화의 토착화’를 찾아낸다. 밖에서 들인 낯선 것을 뚝딱뚝딱 일본식으로 변형하는 기술 말이다.
▲라멘 조리법 배우는 건 ‘수련’
저자가 또 하나 유심히 걸러낸 것으로 ‘내셔널리즘’이 있다. 여기도 단적인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중국식 특유의 빨간간판 인테리어를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 종업원이 사무에(일본 공예장인이나 승려가 입는 작업복) 차림으로 서빙이나 조리를 하는 것 등이다.
라멘 한 그릇 내는 일도 참 ‘대단’하다. 좋게 얘기하면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고, 까칠하게 얘기하면 아주 유난스러운 이벤트다. 머릿수건을 질끈 동여맨 요리사가 집중력을 다해 면을 말고 마치 사무라이 같은 카리스마를 육수에 부어대는데. “단 한 방울의 국물도 남기지 말라”는 암묵적 강압이 그것이다. 이들 요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라멘 조리법을 배우는 과정도 ‘수련’이라고 특별히 칭한단다. 이를 두고 저자는 지금 세대에게 일본의 역사·전통을 각성시키려는 의식의 매개역할을 라멘이 담당한다고 봤다.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멘’ 사이
한국의 라면과 일본의 라멘. 그 사이에 중국까지 끼어 있다. 이들 삼국이 그나마 투덕거리지 않은 사안은 ‘먹는 일’뿐이었을 거다. 라면이든 라멘이든. 지금이야 상승곡선을 탔다지만 이들이 서러웠던 지점은 분명히 있다.
일본에서 인스턴트라멘을 처음 만든 배경에는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일조를 했다. 과잉생산한 밀 처리에 고심하던 미국정부가 1954년 이후 일본·한국·타이완 등에 원조라는 이름으로 밀을 팔아치웠던 거다. 이즈음부터 시작한 대대적인 분식장려운동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라멘의 탄생을 부추긴 비화인 셈이다.
‘젊고 가난하고 외롭고 눈물나는 생활’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를 잠깐 떠올려보자. 주인공 ‘철이’(일본명 호시노 데쓰로)는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라멘을 먹어댄다. “인류 입의 영원한 친구”라는 수식까지 붙여가며. 드넓은 우주공간이 아니어도 된다. 좁은 방 한가운데서 라면을 끓인 양은냄비를 끌어안은 한국의 젊은이 역시 시대극이라면 빠뜨릴 수 없는 뭉클한 장면이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진중하게 들여다볼 형편이 된다면 책은 인문역사서로 꽤 유용하다. 하지만 그저 라면이 좋아서 라멘이 궁금해서 덥석 잡았다면 책장 넘기는 데 적잖은 인내심이 필요할 듯싶다. 오래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식량난 해결에 라멘이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결론으로 삼은 건 라면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의도가 진정성을 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