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 탐방은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한교총은 조선 정부가 입국을 정식 승인했던 선교사인 호러스 언더우드(1859~1916)와 헨리 아펜젤러(1858~1902)가 입국한 1885년을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여기고 기념해왔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은 해다. 그에 맞춰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기독교의 뿌리를 되짚는 근대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항구도시 군산은 개항을 통해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기독교가 빠르게 자리잡은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이다. 한교총은 이날 △군산 선교 기념탑 △군산 첫 선교지 △군산제일고등학교 △군산 구암교회, △군산 3·1 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군산 선교는 초기 선교사 7명 중 한 명인 윌리엄 전킨(1865~1908, 한국명 전위렴)과 의료 선교사 드루(1859~1924, 한국명 유대모)가 선교 결심을 굳히고 군산을 다시 찾은 1985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올해가 군산 선교 130주년인 셈이다.
전킨과 드루는 군산 수덕산에 있는 초가집 두 채를 구입해 교회와 진료소를 마련하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전킨의 집을 예배당으로, 드루의 집을 진료소로 사용했다.
군산시 금동 수덕산 자락에는 산기슭 모양으로 제작한 군산 첫 선교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일정에 동행한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향후 예배당과 진료소가 궁멀(구암동)로 옮겨졌으나 수덕산은 전킨과 드루가 군산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전킨은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고등학교인 군산제일고등학교의 전신 ‘군산 영명학교’의 설립자다. 군산 영명학교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1903년에 세운 학교다. 군산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한 군산 3·5 만세 운동은 전북 주민들이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기념사업추진위 상임대회장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당시 미국 선교본부는 정치적 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고,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제의 반인권적 만행이 도를 넘자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끔 각성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군산 구암교회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다. 전킨이 1899년 구암동산에 세운 교회인 군산 구암교회는 호남과 충청 지역의 선교 교두보이자 지역 교회와 선교 거점 역할을 했으며 3.5 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2008년 개관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군산 3.5 만세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는 곳이다. 뒤편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는 전킨과 드루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전킨은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을 ‘궁멀 전씨 전위렴’이라고 칭하며 “궁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군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
군산 다음으로 찾은 곳은 충남 강경이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 중 한 곳인 강경에서는 △강경 침례교회, △강경성결교회, △병촌성결교회 등지를 방문해 일제의 위협과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다.
뒤이어 도착한 강경성결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한 교회였다. 1918년 10월 성결교단에서 파송한 정달성 전도사가 한옥 2칸을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로 신사참배 거부 사건과 일본 역사 교육 거부 사건을 선도했다.
영국 출신 존 토마스 선교사가 옥녀봉에서 만세운동을 지켜보다가 일본 경찰에게 각목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토마스는 해당 사건이 외교 문제로 번진 뒤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교회 예배당 건립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마지막 방문지로 찾은 병촌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된 곳이다.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 의해 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으로, 이를 기리는 ‘66인 순교 기념탑’과 안보기념관이 조성돼 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6·25 전쟁 시기 북한 인민군 등에게 병촌성결교회 교인 54명이 학살된 진실이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병촌성결교회 이성영 목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기독교 정신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는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는 북한 인민군의 위협과 고문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교총 관계자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교육, 의료, 독립운동, 신앙적 저항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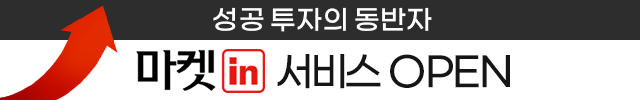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로봇 청소기인 줄" 자율주행 중 3분 만에 벌어진 일[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010124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