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는 1일 서울 버스개혁 2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리 및 중대사고 발생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없이 해당회사의 수입금만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시에서 노선이나 운행방식을 맡으면서 사업자에게 운행비용과 적정이윤 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이 되면서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이 오히려 이뤄지지 않거나 음주 운전, 횡령·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황 교수는 “버스회사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업체 주도로 원가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서울 시내버스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가 승용차 통행속도보다 늦어져 버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케파를 계산하지 않고 많은 경기버스가 서울 중앙차로에 몰리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2.3km/h에 달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2022년 17.2km/h까지 낮아져 승용차 도심속도 19.2km/h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우선신호 도입 △승용차 수요를 흡수할 쾌적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간선급행버스체계((S-BRT·ART) 고도화 △중앙전용차로에 대용량 굴절버스 투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서울 버스 요금 파리 절반도 안돼…인상 정례화 법 만들어야”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버스의 경쟁 가능한 시장 여건 조성’ 방안을 설문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회사의 퇴출 및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제 시행으로 인수합병(M&A)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평가제도의 현실화, 평가 결과의 공개, 합리적인 인센티브·페널티 구축 등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전했다.
임 교수는 버스회사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교통복지 할인 지원’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등 시민이 누리는 교통복지 사업인 만큼 그 손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요금 인상 방식을 합리화도 언급했다. 임 교수의 조사 결과 서울 버스 요금(월별 요금 기준)은 뉴욕의 36%, 런던의 41%, 파리의 53%, 도쿄의 74% 수준이었다. 1인당 월 소득 대비 월 버스 요금 비중은 서울 1.62%로 런던 2.87%, 도쿄 2.52%, 뉴욕 2.33%, 파리 1.8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뉴욕시의 경우 2년마다 물가인상률 수준의 요금인상을 정례화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조례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법으로 정해서 지자체장을 정치적 부담해서 해방시킬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의 위상을 정립하고 버스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준을 높여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높이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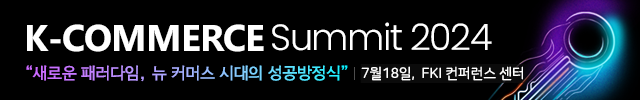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러닝머신 뛰다 쓰러진 남편”…심정지 환자 살리고 떠난 경찰[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116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