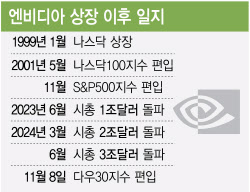|
그는 진행자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라고 묻자 “경증하고 중증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지금 처음 알았다”며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보는 거다. 응급실이라는 게 응급한 환자도 있지만 본인이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고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응급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돈과 연관이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엄격하게 나누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나눠서 중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선택과 집중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돈을 아끼고자 하는 시도”라며 “경증 환자에 들어가는 국민보험공단 지급금, 본인 부담금을 90%로 올리면 병원이 돈을 더 버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액은 똑같다. 그 돈은 원래 공단이 내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증 환자) 본인이 내라고 하는 것이지 않는가? 결국 승자는 공단이 맞는데 이익은 누가 볼 것이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원 이용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갈등이 현장에서 당연히 생긴다”라고 했다.
또 “(경증이냐 중증이냐) 판단을 의료진이 하면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 책임과 문제를 다 의료기관과 개인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 여파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운영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6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4~5급에 해당하면 비응급·경증응급환자로 분류한다는 건데, 환자나 보호자가 증상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환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응급실에) 갈 수는 없고,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차관은 “(그렇게) 너무 브로드하게(넓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일반화한 발언이었고,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전용기 옆자리 그녀…유리천장 깨고 오른팔 등극[파워人스토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43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