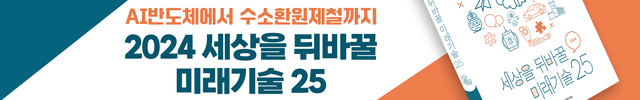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은 미분양 호실들의 관리비가 약 5500만원 연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호실들은 건설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는데, 신탁회사는 “우리가 건설사와 맺은 계약에 관리비는 건설사가 낸다고 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1·2심 법원은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계약서가 등기부에 포함돼 있고, 거기에 ‘관리비는 위탁자(건설사)가 낸다’고 적혀 있으니 신탁회사는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2년 7월 개정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등기로는 “이 재산이 신탁재산이다”라는 사실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관리비는 누가 낸다’ 등을 포함한 계약 내용까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아래에서 신탁회사가 관리비 납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용한 예전 판례가 옛 신탁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체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는 관리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