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급증하는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토 국토교통상도 이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여행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문제는 대화가 ‘합의’가 아닌 사실상 ‘부탁’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내용만 보면 참담할 정도로 굴욕적이었다. 양국 관광 교류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을’이 아닌 ‘갑’의 입장이다. 박 장관의 말처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일본 관광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7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160만 651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대만(79만명)과 홍콩(42만명) 등을 압도하는 숫자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인이었던 셈이다.
우리 국민의 씀씀이도 가장 컸다. 한국인 방문객이 1~3월 일본에서 쓴 총 여행 비용은 1999억엔(약 1조 9700억원)으로, 국적별 지출 규모에서는 가장 많았다. 이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총지출액 1조 146억엔의 19.7%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인의 방한관광 비중은 매우 느리게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월 방한한 일본인은 35만 2000명으로 2019년의 44.4%에 불과했다. 오는 이보다 가는 이가 약 다섯배 더 많았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먼저 일본 입장에서 관광 교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따로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국의 장관이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읍소했다는 점이 너무나 참담했다.
오히려 박 장관이 큰소리를 쳤다면 어땠을까. 박 장관은 한국인의 일본여행 열풍을 지렛대 삼아 일본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다. 우리 관광수지가 절대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독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일본 교과서 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지렛대 외교는 비일비재하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라는 비공식적인 보복 조치와 불매운동·차별 공격을 한국 측에 퍼부었다. 이후 한국 연예인이 등장한 영화·드라마·음악 등 K콘텐츠 상영·공연과 광고·양국 공동제작이 전면 금지됐고, 중국 내 한국 화장품 판매 급감과 한국 식당 폐업이 잇따랐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중국 사업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일본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관광산업은 이제 국가 대항전이다. 과거처럼 관광산업은 ‘정치’가 아닌 ‘민간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야기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관광산업도 무기가 되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특히 한 나라의 장관은 국익을 지키는 영업사원이다.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하지만 국익에서는 일본에 밀리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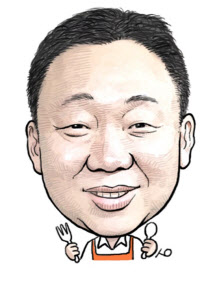



![“명품인 줄” 이부진, 아들 졸업식서 든 가방…어디 거지?[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59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