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세상이 원래 그랬다. 빛과 그림자였다. 빛이 없다면 그림자가 의심을 받았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의심을 받았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보지 못했다면, 세상을 제대로 봤다고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나. 빛을 좇는 일이 희망을 좇는 일이었던 것을.
여기, 그 빛을 고민해온 4인의 작가가 한데 모였다. 서울 중구 통일로 아트스페이스선에서 연 기획전 ‘빛의 풍경’을 함께 빚은 이들이다. ‘일상 공간에 빛을 들인’ 황선태(50), ‘무형 물속에서 빛을 찾은’ 송창애(49), ‘초자연 성소에 빛을 올린’ 이정록(51), ‘추상 조각에서 빛을 꺼낸’ 엄익훈(46). 이달 30일까지 이어갈 전시는 이들 4인이 LED로, 수압으로, 카메라로, 금속으로 각기 다른 ‘빛’을 잡아낸 회화·평면·조각·설치 등 20여점을 걸고 세웠다.
소재도 기법도 도구도 장르도 다른, 4인 작가의 빛 작업을 하나로 뭉뚱그리긴 쉽지 않다. 빛을 그리고 빛을 조각하는 작업, 그 이상이란 뜻이다. 강렬한 섬광이라기보다 섬세한 파장인, 그래서 ‘빛의 향연’이기보다 ‘빛의 철학’이라는 게 맞을 거다. “왜 빛인가” 물었더니 “어떤 삶이라서”라고 대답한 4인의 작품세계가 이미 ‘빛’이다.
|
|
◇황선태, LED로 빛 붙이고 그림자 덧대…유리판에 햇살 드리운 듯 온기 넣어
“빛과 선으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어느 시간에 어떤 빛이 드리웠던가, 작품을 보며 지난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작업이다. 공간은 일상에서 모은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인터넷 캡처도 한다. 과거에는 미니어처로 만들기도 했다. 작게 연출해 빛이 드리워진 공간을 촬영하고 작업했다. 요즘은 건축가가 쓰는 3D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처음부터 작정한 공간, 작정한 빛은 아니다. 의도한 거라면 한 가지, 공간 속 사물 이야기를 최대한 단순화해 좀더 본질에 다가서 보자는 거다. 빛과 선이 그 일을 한다. 눈앞의 사물을 보게 하는 게 빛이라면,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선인 셈이다.”
황 작가의 빛은 LED다. 강화유리에 선으로 스케치한 이미지를 입힌 뒤 뒷면에 LED로 빛을 붙이고 그림자를 덧대는 방식이다. 불투명한 유리판에 초록색 실선뿐인 화면. 유리로 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겪을 만큼 다 겪었단다. 그럼에도 화룡점정은 되레 스위치에 내준다. ‘온’으로 올리는 순간 냉랭한 유리판이 햇살로 환해지며 온기가 감돈다. 선뿐인 납작한 사물·공간에 입체감을 심는, 대표연작 ‘빛이 드는 공간’(2016·2017·2018)이 변천한 과정을 볼 수 있다.
|
◇송창애, ‘물 드로잉’ 독특한 기법으로 작업…수압 통해 역동적 힘 만들어내
“물로써 물을 그린다. 외부의 물리적 현상보다 내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흐르는 물을 붓처럼 끌어들여 작업하는데, 외부의 나와 내면의 내가 합의를 보는 매개가 물인 거다. 빛은? 없어도 보인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발현된다.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작업에서 촉발하는 현상의 하나로. 그게 생명현상이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그림이 태어난다고 여기기도 한다. 내용과 형식이 합쳐지는, 전통 미의식을 끌어내는 데 관심이 많다. 기운생동·신명 등의 정신·사상을 탐구하고 이을 수 있는 현대적 조형어법을 찾다가 물을 만난 거다. 물감이 아니어도 물 자체로 순수한 형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송 작가는 ‘물 드로잉’이란 독특한 기법으로 작업한다. 장지에 깊고 푸른 전통안료를 올려두고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강한 물을 쏘아 형체를 만드는 거다. 핵심은 수압이란다. 물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혹여 흔들리기라도 하면 엉뚱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다. 그렇다고 미리 구상한 그림이 있는 건 아니다. 순간적이고 역동적인 현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작 ‘워터스케이프’(2014·2017·2019)를 비롯해 최근 몰두하는 ‘워터스케이프-물꽃’(2021) 등을 걸었다.
|
◇이정록, 신비로운 원시자연에 ‘찰나의 섬광’ 찰칵…태고의 우주로 돌아간 듯
“오래전부터 풍경작업을 위해 숲이나 호수·바다, 유적지를 돌아다녔다.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 그런데 그 기운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진에 찍히질 않는 거다. 어느 날 현대물리학에서 힌트를 얻었다. 공간이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됐다고 말하고 있더라. 그때부터다. 눈에 보이고 사진에 찍히는 것은 물질, 강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에너지일 거라며 풍경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빛은, 바로 그 공간에서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다. 입자와 파동이란 빛의 양면성이 물질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적절했다. 오랫동안 찾아다닌 성소, 그 특별한 분위기까지 빛이 다 한다.”
이 작가는 ‘사진을 그린다.’ 신이 빚은 듯한 신비로운 빛을 씌워 현재의 공간을 태고의 우주로 되돌리는 듯하다. 작업에는 자연광, 플래시의 순간광, 서치라이트를 총동원한단다. 카메라렌즈를 오래 열어두고 어둠이 내릴 때부터 플래시를 계속 터뜨리며 순간광을 쌓는데, 아날로그 필름에 찰나의 섬광이 내는 흔적을 입히는 식. 그렇게 만든 빛을 나무에 매단 연작 ‘생명의 나무’(2013), 공기 중에 흩뿌린 연작 ‘나비’(2015), 원시자연에서 잡아낸 빛의 아우라 ‘아이슬란드 12’(2019) 등을 꺼내놨다.
|
◇엄익훈, 돌돌 말아 연결한 금속판, 빛 투과하니 사람 그림자…‘삶의 순간’ 포착
“주제를 골라 드로잉을 하는 것부터다. 그 드로잉을 머리에 입력하고 이미지를 주입하면서 유닛을 만든다. 이후 조명을 달고, 유닛을 공간에 드로잉하듯 용접해 세팅한다. 2007년에 첫 개인전을 했던 당시는 추상조각만 했다. 주제가 우주 하나뿐이었고, 작은 유닛을 모아 거대한 덩어리를 표현하려고 했다. 얼마 뒤 빛을 도입하면서 그림자가 생겼고 이미지도 변화했다. 테마는 ‘조각의 환영’이다. 조각은 금속 추상조각을 말하는 거고, 환영은 조각에서 빠져나온 그림자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삶의 순간’이란 소주제가 덧붙었다. 가상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이고 싶어 유토피아적이고 행복한 이미지를 상상하려 한다.”
엄 작가는 작업은 ‘그림자 조각’ ‘그림자 드로잉’이다. 드로잉도 하고 조각도 하지만, 그림자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는 작품을 빚는다. 사람의 근육·골격을 떠올릴 형체는 돌돌 말아 연결한 금속판. 그 작은 유닛을 잇고 그 틈을 빛으로 메워, 진짜 사람 형체를 그림자로 쏘아내는 거다. 뭐가 실제고 뭐가 환상인지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조각에서 어찌 저런 그림자가 나오는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저 조각의 마음이 그러니까. ‘꽃을 든 소녀’(2019), ‘목마 타는 아이’(2020) 등을 세우고 비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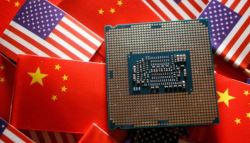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003t.jpg)
![영하권 아침 기온에 강풍까지…일부 지역은 눈·비[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01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