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미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민감국가 해제 수순이 진행될 것이라 낙관하는 모습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 하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이날까지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것은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감국가에 따른 조치는 미국 시간으로 15일 자정(한국시간 15일 오후 1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측이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도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다. 북한이나 이란 등이 이름을 올린 ‘민감국가’에 한국도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또 과학연구나 협력에서 절차상 제약이 생기며 한미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발간한 민감국가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민감국가 지정사유에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주요 협상 의제를 한 번에 묶어서 논의하는 ‘패키지딜’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감국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와의 협상에서 수세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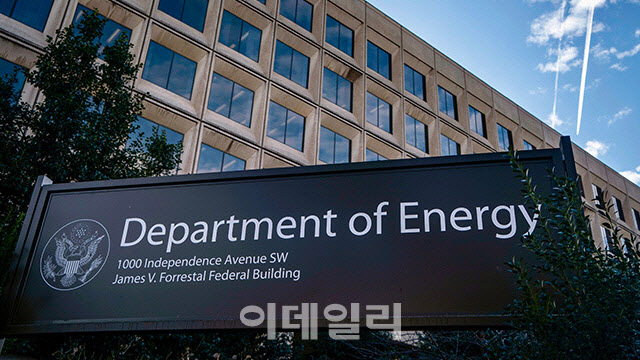







![“꺄악!” 시민들 혼비백산…친구에 칼 휘두른 소년 그 내막은[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2600001t.jpg)